[수학] 왜 ‘기하급수’라고 부를까? (한국에서 수학은 영어로 배워야 하는 이유)
📚 왜 ‘기하급수’라고 부를까? — 이름에 숨은 역사
수학을 배우다 보면 꼭 등장하는 기하급수.
하지만 이름만 놓고 보면 “기하학과 관련된 급수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여기에는 역사적 번역의 흔적이 숨어 있습니다.
1. 기하급수의 정체
먼저 기하급수가 뭔지부터 짚어볼까요?
이처럼 항이 일정한 비율(공비, ratio)로 곱해지는 수열을 **등비수열 (geometric prog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항들을 더한 것이 바로 **기하급수 (geometric series)**죠.
즉, “기하급수 = 등비수열을 항으로 가지는 급수”입니다.
2. 왜 하필 ‘기하(geometric)’일까?
여기서 “기하(幾何, geometric)”는 **기하학(geometry)**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비례, 비율(proportion)”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
등차수열 (arithmetic progression): 항이 일정한 차(덧셈)로 이어짐
-
등비수열 (geometric progression): 항이 일정한 비율(곱셈)로 이어짐
즉, 산술적(arithmetic) vs **비례적(geometric)**이라는 대비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 수학에서 “비율”은 기하학에서 주로 다뤄졌기 때문에 geometric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이죠.
3. 일본식 번역의 영향
한국어 교재에서 쓰는 **“기하급수(幾何級數)”**는 사실 일본에서 만들어진 번역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
幾何(기하) = geometric
-
級數(급수) = series
하지만 현대 한국어에서 “기하”는 거의 항상 **기하학(geometry)**을 가리키다 보니,
“기하급수”라는 표현이 괜히 “기하학적 무슨 특수한 급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냥 비율로 이어지는 수열의 합일 뿐인데요 😅
4. 이름이 불러오는 오해
이름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
“기하학과 관련 있나?”
-
“도형이랑 연결되는 건가?”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공비로 곱해 나가는 수열의 합”이라는 단순한 개념이죠.
차라리 한국어로는 “등비급수”라고 불렀으면 더 직관적이지 않았을까요?
✅ 마무리
정리하면,
-
기하급수 = 등비수열을 더한 급수
-
“기하(geometric)”는 **비례(proportion)**에서 온 말
-
일본식 번역어 때문에 오늘날 한국어에서는 괜히 “기하학” 느낌을 풍기게 된 것
👉 그러니 “기하급수”라는 말이 나오면, “기하학”은 잠시 잊고 비율로 이어지는 수들의 합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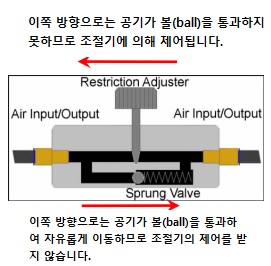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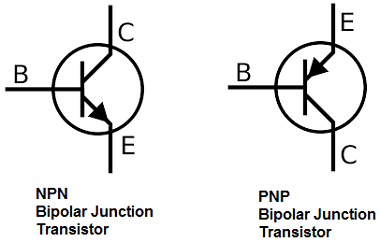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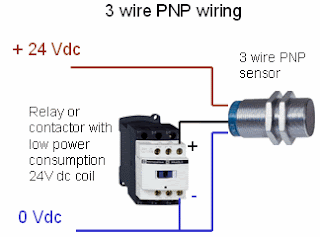



댓글
댓글 쓰기